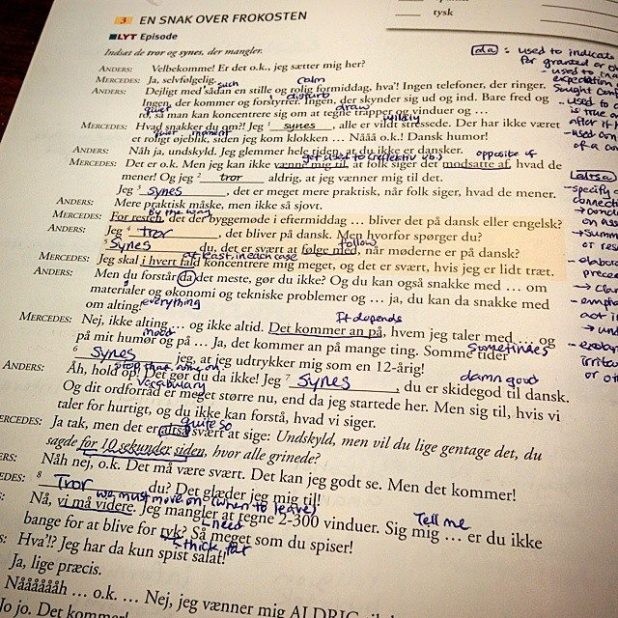I brought my puppy, Boree(meaning barley in Korean and Boree’s color is like barley’s), from Korea and here’s how to bring your puppy to Denmark.
It’s more easier to bring your puppy from EU countries than third countries apart from EU. This information is focused on bringing one from the 3rd countries(which was not even listed in the Annex 2, Part B, section 2 and Part C to EU Regulation 998/2003/EEC to be more difficult) but you can refer the information, bringing one from EU, from the same website.
Information regarding traveling with living animals to Denmark is provided by the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at its website.
I had to prepare a Veterinary Certificate and get it signed by a competent authority in Korea. The EU form is given in the page above and here is the link of the form.
There are some requirements before preparing the certificate. (This is the most difficult case, since Korea belongs to the third countries not listed in the Annex 2.)
- Microchip or tattoo (done before the first rabies vaccination)
- Veterinary certificate or Pet Passport that certifies the requirements
- Valid rabies vaccin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manufactor of the vaccine
- A blood sample testing the rabies antibody level – must be drawn at least 30 days after vaccination
- The blood sample must be examined by an EU authorised laboratories
- The result of the rabies antibody level test must be at least 0,5 IE/ml
- The animal can not enter Denmark (the EU) until three (3) months after the date when the blood sample was drawn and only if the result is in accordance with the requirements. (This three-month period shall not apply to the re-entry of an EU pet animal whose passport certifies that the titration was carried out, with a positive result, before the animal left the territory of the EU. The antibody test need not be renewed on a pet animal which has been re-vaccinated against rabies before the validity of the previous vaccination expires.)
Source : Ministry of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First thing to do is having microchip implanted into your puppy or getting the tattoo. I chose to have a microchip implant. It can be done at your local veterinary clinic. The vet will register the pet information to the relevant authority. The chip should better be conform with the ISO standard so that the information can be read wherever you go.
Then your puppy should have valid rabies vaccination. Boree had already been vaccinated 10 months back which was less than a year, a regular cycle for rabies vaccination. However she had to get re-vaccinated before the regular cycle in due since she didn’t have a ID microchip yet. So the chip has to be implanted first and the vaccination comes later. When it gets vaccinated, the chip information will also be mention on the certificate where the vet signs on.
Then the blood sample should be tested by an EU authorized labs. Make sure that the blood sample be drawn at least 30 days after vaccination. Here is the list of the EU authorized labs in 3rd countries. There are chances that your vet doesn’t know where are the authorized labs like mine didn’t. So I had to give the contact information to the vet. In Korea, Animal and Plant Quarantine Agency(QIA, http://www.qia.go.kr/) provides the testing services. The result of the rabies antibody level test must be at least 0,5 IE/ml.
The animal can only enter Denmark after 3 months after the date when the blood sample was drawn and complying the testing criteria of rabies antibody level. It means that it takes minimum 4 months after rabies vaccination. If you plan to travel with your puppy, make sure that your time frame could work with it.
And when you book a ticket, make sure with airlines that you are traveling with that you are accompanying your puppy and if the aircraft is capable of carrying it. Some airplanes don’t have the space for pets so chances are that you should change your flight schedules. Boree was lucky to fly without problems. Since there was no direct flight from Korea to Denmark, she also had to transit at the Schipole airport where she got on board with fellow human passengers(though she was covered with a big blanket not to be seen by them.) A cage would be considered as an extra luggage no matter how light it is.
Anyway, back to the procedures, in Korea, one has to make a reservation for quarantine services prior to the departure. They review the rabies vaccine certificates, health certificates(not mandatory) and check up pets health conditions by looking then sign on the Veterinary Certificates that one has prepared. It doesn’t take a long time. One can do it one or two days before the departure since it could be a hassle to be done on the departure date. So I did it a day before.
Contact Border Inspection Post before you fly. You could just email them. I tried to call many times but failed. But one day right after I emailed them, they replied. Here’s the contact information.
Border Inspection Post, Kastrup at Copenhagen Airport
Kystvejen 16
DK-2770 Kastrup
If the puppy is lighter than 5 kgs including the cage weight, it can fly with you under the seat. But Boree was a bit tall to stay under the seat more than 10 hours, so I choose to buy a big cage where I could put her favorite blankets and cushions together and she could rest. It must be stressful in any case, but she had some knee joints issues and I knew that she couldn’t handle 10 hours under the seat. Impossible. Don’t feed your puppy too much before flying so that it won’t throw up.
When you land at the Kastrup airport, go to the odd-sized luggage pick up desk and go through the red custom line. Then they will cut the seal on the cage, check documents and scan ID microchip and release your puppy.
Velkommen til Danmark! (Welcome to Denmark!)
저는 덴마크에 제 강아지 보리(밝은 갈색 푸들이라 이름을 보리로 지었어요.)를 한국에서 데리고 왔어요. EU국가에서 덴마크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제3국(EU 이외 국가)에서 데리고 오는 것보다는 쉬워요. 이 정보는 한국과 같이 제3국(그것도 EU 규정(Part B, section 2 and Part C to EU Regulation 998/2003/EEC)의 부속서 2(Annex 2)에 명시되지 않은 국가라 더 힘들었죠)가에서 덴마크로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방법에 대해서 적은 점을 참고해주세요. 한국에서 데리고 오는 것이 가장 힘든 것으로 그 외 국가의 경우 최소한 같은 난이도이거나 더 쉽습니다. (다른 국가에서의 강아지 동반 입국 방법은 관련 규정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덴마크 애완견 동반에 대한 규정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출국하는 것이니 당연히 한국 관련 당국에서 서명한 검역증명서(Veterinary Certificate)를 받아야 했죠. 링크의 EU 양식에 본인이 기재할 부분만 기재해서 검역 당일에 지참해 가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에 검역당국에서 담당 검역 수의사가 작성할 부분을 추가 작성해 서명날인함으로써 검역증명서가 발급됩니다.
정상적으로 덴마크에 애완견을 데리고 가기 위해 몇가지 충족할 요건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부속서 2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라 요건이 가장 복잡하죠.
- 마이크로칩 또는 문신(최초 광견병 백신 접종전 삽입 또는 문신을 완료할 것)
- 사전 요건을 모두 만족했음을 확인하는 검역 증명서 또는 동물여권(Pet Passport)
- 백신 제조사의 권고방식에 따라 유효하게 접종한 광견병 백신
- 광견병 항체 검사용 체혈은 백신 접종 이후 최소 30일이 경과한 후에 할 것
- 항체 검사는 EU에서 승인된 실험실에서 할 것
- 광견병 항체가 최소 0,5 IE/ml이상이 될 것
- 체혈 이후 최소한 3개월 이상이 되고, 검사 결과가 0,5 IE/ml 이상이 될 때 덴마크 입국이 가능
출처 : 덴마크 농수산식품부
첫번째 할 일은 우선 애완견에 마이크로칩을 삽입하거나 문신을 하는 것입니다. 신분 증명용인데, 전 마이크로칩 이식을 선택했어요. 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고, 동물병원에서는 가까운 구청에 해당 칩 정보를 신고합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마이크로칩 이식이 의무화되었던 것 같은데요, 약간의 등록비가 듭니다. 칩 이식때는 반드시 ISO 기준에 부합하는 칩을 삽입해야 다른 나라에서 인식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아마 이제는 전부 ISO 규정에 부합하는 칩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싶어 동물병원에 꼭 그래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광견병 백신 접종을 해야 해요. 보리는 10개월전에 접종을 했고, 다음 접종시기까지 2개월이 남아있었지만, 그 전 접종이 칩 삽입 이전에 이뤄진 것이라 의미가 없어서 다시 접종을 했어요. 접종하고 나서 동물병원에서 발급하는 광견병 백신 접종 확인서에는 ID 칩 번호를 적어줍니다.
이 접종확인서 상 날짜로부터 30일 이후에 체혈을 해야 해요. 혹시나 싶어 31일 이후에 했습니다. EU 승인 실험실 리스트에서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곳인 농림수산검역본부(QIA, http://www.qia.go.kr/) 연락처를 동물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잘 모르는 병원도 많으니,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간에 절차가 꼬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죠. 실험 결과가 EU 기준치에 맞지 않으면 다시 접종하던가 해야 하나봐요. 보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정상적으로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개월간 기다리는 이후는 혹시 있을 지 모르는 광견병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체혈 이후 3개월이고, 체혈 1개월 전 접종을 해야 하니, 검역까지 최소 4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서 출국 전 준비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항공권 예약할 때, 항공사에 애완동물과 여행을 같이 할 것임을 통보해야 하고, 예약한 비행기가 애완동물 수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비행기가 다 애완동물 수용이 가능한 건 아니라네요. 공간이 없는 기종도 있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공간이 작아 1~2마리만 수용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저처럼 직항이 아닌 경우, 연결편까지 모두 확인을 해야 하죠. 따라서 한개의 일관된 항공사로 끝까지 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환승하면서 보리는 코펜하겐까지 1시간 반은 큰 담요를 케이지에 뒤집어 씌운 채로 비행기 맨 뒷편에 승객과 함께 탑승했습니다. 그리고 케이지는 무게에 상관 없이 화물로 실을 경우 추가 수하물로 취급되어 해당 비용이 발생합니다.
다시 검역 절차로 돌아가면, 출국 전에 미리 출국검역신청 예약을 해야 합니다. 검역시 백신 증명서, 항체 검사 결과, 건강증명서(이건 의무사항은 아닌데, 동물병원에서 발급 받았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봅니다.) 등을 보고, 임상 검사를 한 후에 미리 본인 작성부분을 다 작성해서 준비해간 검역증명서에 검역 담당 수의사가 서명을 해줍니다. 이는 하루나 이틀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출국 당일 할 일도 많은데 정신이 없을 수 있어 저는 미리 했습니다. 이 또한 예약은 농림수산검역본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출국 전에 또 할 일은 덴마크 국경검사포스트에 연락을 해두는 것입니다. 이메일이 편합니다. 전 전화로 몇번 하다가 실패하고 이메일을 보내니 바로 다음날 답장이 왔습니다. 동반할 동물 종류와 입국 시점 등을 보내두니 검역 포스트에 연락해두겠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연락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Border Inspection Post, Kastrup at Copenhagen Airport
Kystvejen 16
DK-2770 Kastrup
만약 애완견이 케이지 무게를 포함해서 5킬로그램보다 가벼우면 주인과 함께 기내에 탑승해 앞좌석 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리는 다리가 긴 편이고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어 무게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그 아래에서 10시간 비행하기엔 아무리봐도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큰 케이지를 사서 보리가 좋아하는 담요와 쿠션과 함께 화물칸에 실었습니다. 탑승전 최소한 4시간 이전에 먹거나 마시는 것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토할 수 있어선데요, 양도 많이 주지 않는게 좋습니다.
코펜하겐 카스트룹 공항에 도착하면 비규격 사이즈 수하물 코너에서 케이지를 찾아서 통관시 신고할 것이 있는 빨간 줄로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관련된 케이지에 봉인을 열고 마이크로 칩을 스캔하고 서류를 점검한 후에 애완견을 넘겨줍니다. 얼마나 보리가 낑낑대던지요.
Velkommen til Danmark! (덴마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