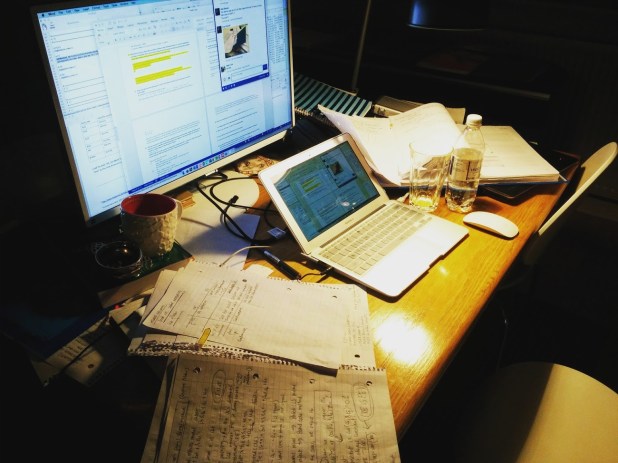11월 말이 되니 Spotify에 캐롤 믹스가 넘쳐난다. Julesange du kender (Christmas songs you know)라는 믹스가 추천으로 떠서 틀어보니, 덴마크 크리스마스 노래 중 내가 제일 좋아하는 Jul-Det’Cool이라는 노래가 첫곡으로 나온다. 이젠 나이가 꽤나 든 덴마크 래퍼인 Mc Einar의 노래인데, 소비지향적인 크리스마스를 덴마크인 특유의 아이러니한 유머로 비꼰 노래다.
Jul-Det’Cool by Mc Einar

왼쪽이 MC Einar. (Source: BT)
Det skete i de dage i november engang
at de første kataloger satte hyggen i gang
Det’ jul, det’ cool, det nu man hygger sig bedst
det’ julebal i Nisseland, familiernes fest
med fornøjet glimt i øjet, trækker folk i vintertøjet
til den årlige folkevandring op og ned ad Strøget
der bli’r handlet, pakket ind, og der bli’r købt og solgt
tøsne, snot i næsen, det’ pisse koldt
det er vinter, man forventer vel lidt kulde og sne
men det’ da klart at en såd’n sag må komme heuj bag på DSB
intet vrøvl har de forsvoret, det de helt sikre på,
men ved den første rim på sporet, går møllen i stå
folk de tripper, skælder ud, og ser på deres ure
og sparker efter invalide, ynkelige duer
der er intet, man kan gøre, de sure buschauffører
gør det svært at praktisere lidt julehumør
“Gå så tilbage for helvede” råber stodderen hæst
men det’ jul, det’ cool, det nu man hygger sig bedst
Det’ jul, det’ cool, gran og lirekasser
der er mænd, der sælger juletræer på alle åbne pladser
12 bevægelige nisser og en sort mekanisk kat
i et vindue ud mod Strøget trækker flere tusind watt
kulørte gavepakker i kulørte juleposer
selv i Bilka og i Irma og i alle landets brugser
er der ægte julestemning og gratis brune kager
der er hylder fyldt med hygge, der er hygge på lager
og hos damerne i Illum kan man få det som man vil
“Kontant eller på konto, hr.? Ska’ prisen dækkes til?”
de smiler og er flinke, mest for fruerne i minke
og gi’r gode råd om alt fra sexet undertøj til sminke
og vi andre fattigrøve, vi ka’ gå i Dalle-Valle
der er damerne så flinke, at de smiler pænt til alle
der er masser tøj i kasser, der helt sikkert passer
det’ jul, det’ cool, gran og lirekasser
Det’ jul, det’ cool, kig dig lidt omkring
15.000 mennesker i Magasin
de har våde lædersko, de har halstørklæder på
de har overfrakker, gavepakker, masser de ska’ nå
men de hygger sig, sel’fø’lig gør de det
plasikstjerner, plasikgran og plastiksne
sætter stemning i systemer, det’ så nemt og nul problemer
køb blot julestuens julesæt med fire fine cremer
eller sukkerkrukker, pyntedukker, pænt, mondænt og ganske smukt
søde sæt med proptrækker, glas og øloplukker
fra en skjult højtalerinstallation,
“Et barn er født i Bethlehem” i Hammondorgelversion
vi’ traditionsbundne folk, i traditionernes land,
så vi hygger os, li’så fint vi kan
og særlig uundværlig, det er Magasin,
det’ jul, det’ cool, kig dig lidt omkring
“Højt fra træets grønne top”
“Mød julemanden klokken 13, 15, og 17 på julestuen på 3. sal”
“Vores velassorterede vinafdeling kan tilbyde et komplet gløgg-sæt for kun 39.95”
“Lille Øjvind på fem år er blevet væk fra sin mor, han kan afhentes i kundeservice”
“Jamen du godeste er det allerede…”
Jul det’ cool sikke tiden den går, der er intet lavet om siden sidste år
det’ de samme ting vi spiser, det’ de samme ting vi laver
de samme ting i TV, de samme julegaver
samme pengeproblemer, det’ dyrt og hårdt
udelukkende overtrukne kontokort
overflod og fråds med familie og med venner
samvittigheden klares med en ulandskalender
det’ julefrokosttid, traditionspilleri, spritkørsel, utroskab, og madsvineri
vi har prøvet det før, vi ved præcis hvad der sker
slankekur i januar og alt det der
det’ et slid, men der er lang tid til næste år
det’ jul, det’ cool. sikke tiden den går
“Jeg drømmer om en hvid sandstrand,
med palmetræer og sommervejr
der vil jeg fejre julen
i swimmingpoolen
langt væk fra sne og juletræer”
옌스는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하는 걸 매우 웃기게 생각한다. 가사도 모르던 이 노래를 처음 좋아하게 된 계기는 크리스마스 시즌의 라디오 방송에서 자주 접하게 되면서부터다. 출근 길에 화장하면서,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항상 들었는데, 거기서 이 노래를 정말 자주 틀어줬다.
옌스가 간혹 나보고 자기보다 더 덴마크인스럽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다. 덴마크 캐롤을 좋아하는 것,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오면 Ris a la mande (프랑스 메뉴인 척 하는 덴마크의 크리스마스 디저트)나 Æbleskiver를 먹고 싶어하는 것, 덴마크식의 self-irony 유머를 즐기는 것 등 말이다. 사실 self-irony 유머는 그냥 여기에 와서 그런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덴마크 문화와 맞아떨어진 개인적 특성일 뿐이지만…
그런데 막상 옌스는 덴마크인스럽지만 덴마크인스럽지 않은 사람이기도 해서 진짜 덴마크인스러운 게 뭔지는 집 안팎을 두루 관찰하고 이야기를 골고루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실제 옌스는 전형적 덴마크인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곤한다. 남들끼리는 공감하는 이야기를 나는 공감하기 어렵고, 반대로 내 경험을 남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덴마크인스럽지 않은 것들을 꼽아보자면… Rugbrød(독일이나 스칸디나비아에서 주로 먹는 호밀빵으로 점심때 먹는다.)은 가족과 점심식사를 함께 하는 행사같은 날 빼고는 안먹는 것 (자기는 어려서 평생 먹을 Rugbrød을 다 먹었다며…), 있으면 먹지만 Lakrids (감초)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각종 종교적 전통을 좋아하지 않는 점 (크리스마스때 선물 교환은 딱 조카들과 나에게만 하고, 가족들에겐 선물 안주고 안받는다고 못을 박아두었다.), 새로운 음식이나 새로운 문화, 언어를 배우는 것 등을 좋아하는 점, 덴마크를 좋아하지만 굳이 덴마크를 자랑스러워하거나 덴마크가 다른 나라보다 우월하다거나 그런 게 없다는 점, 그래서 내 문화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점, 덴마크 국기인 Dannebrog를 딱히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 맥주를 안좋아하는 점 등이다.
덴마크인스러운 점도 물론 많다. 운동을 정말 좋아해서 하루라도 운동을 빼놓는 날이 없다는 점, 매사 성실한 점, 개인생활도 중요하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중시하고 가사분담 참여비율이 높다는 점, 직업 윤리가 투철하다는 점,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점, 집에서 밤에 불 밝게 켜는 것 싫어한다는 점 (현광등은 정말 질색팔색한다. 한국가서 한두달 지내려면 적응하느라 고생 좀 할 듯), 겨울에도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자야하는 점, TPO에 맞는 옷을 잘 차려입는 것 좋아하고 패션에 대한 자기 주관이 뚜렷한 점 (자기 것 쇼핑은 반드시 자기가 한다. 의견은 수렴하지만, 결정은 자기의 몫. ) 등
물론 이러저러한 특성을 굳이 덴마크인스러운 점과 그렇지 않은 점으로 나눴지만, 사실 외국인 남편과 그의 모국에서 살다보니 국민적 특성이란 것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개별특성의 스펙트럼이 평균으로부터 워낙 넓게 펼쳐져 있어 저 구분이 틀리다고 누군가가 말한다면 이 또한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각자 자기가 교제하는 사람과 준거집단을 중심으로만 살펴보게 되서 덴마크인스럽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겐 전혀 덴마크인스럽지 않은 것들도 많고, 내가 덴마크인스럽지 않다고 하는 것도 덴마크인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친구를 초대해서 음식을 넉넉히 하다보니, 다음날 저녁에 데워서 먹을 만큼 넉넉히 남았었는데, 난 그에 곁들일 탄수화물로 빵을 굽고 있는데, 옌스는 밥을 달라고 했다. 서양음식인데 밥을? 이라는 나의 반응과 달리 옌스는 내가 해준 쌀밥이 덴마크 어느 식당에서 먹는 쌀밥보다도 맛있다면서 그걸 달라하고, 간장에 참기름을 달라해서 그 쌀밥위에 끼얹어 먹는걸 보면서 기함했다. Rugbrød위에 남들과 다른 컴비네이션을 얹어먹는 걸 봐도 크게 놀라지 않는 옌스인 걸 생각해보면 그만의 기이한 조합도 딱히 놀랄 일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요즘 방송에서 “진정한 덴마크인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걸로 이것 저것 다양하게 다룬다. 토론, 뉴스, 다큐멘터리 등등… 옌스는 그런 토론 자체가 정말 피곤하고 언론에서 덴마크인이라는게 뭐 대단한 거고 그게 얼마나 통일성이 있는 것이고 독창성이 있는 거라고 그걸 그렇게 따지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사회공동체 의식, 개인주의 등 가장 핵심적인 가치만이 지켜진다면 사회는 항상 변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할 것이고, 개인마다 덴마크인다움에 대한 정의가 다 다른데 그걸 dansk함과 udansk함을 나누는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한다. 나에게도 “너는 한국인이고, 한국인 다움이 있지만, 이곳에서 살면서 이곳의 가치에 영향을 받으며 한국에서 갖고 있던 가치관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너도 덴마크인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언젠가는 내가 한국인인 것만큼 덴마크인도 되어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실제 내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과 함께 덴마크인의 행복함의 원천에 대해서 휘게와 기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찾고 이를 홍보하고 수출하는 것도 피곤하다고 한다. 그냥 타인과 비교 별로 안하고, 현실감있는 목표를 정하고, 형식주의를 배격하고, 서열의식이 적고 자연환경이 좋은 편이어서 다른 나라사람들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덜 받고, 그래서 행복한 거 아니냐고. 그게 우리에게 특별한 비결이 있어서가 아니란다.
이럴 때 난 덴마크인이지만 덴마크인이기만 하지 않은 옌스와 결혼을 한게 참 안도가 된다고 할까? 안그래도 타국에서 살면서 적응할 게 많은데 그걸 강요당한다거나 기대를 받는다면 어땠을라나? 여기의 룰에 맞춰가야 한다는 기본 전제를 깔고 다름을 같음으로 맞춰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과, 내가 다른 건 옌스가 다른 덴마크인과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다르다고 전제를 깔고,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무리 없이 편입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고 적응을 도와주는 것은 엄청난 차이이다.
이번에 새로 주문한 한국어 책에서 (한권을 드디어 끝냈다. ㅠㅠ) “하다”동사를 활용한 한국어 동사변형의 여러가지 유형이 정리되어 있었다. 이걸 패턴드릴로 연습한다고, 몇가지 동사를 주면서 이걸 같은 형식의 테이블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만들어줬더니, 다음날 회사에서 출력을 해갖고 온 것을 보여주며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한다. 사실 옌스랑 나는 주중엔 퇴근 후 30분정도 그날 있었던 이야기 좀 하고, 같이 뉴스 보고, 각자 할 일 하다가 소파에서 30분 정도 같이 앉아 쉬고, 또 각자 할 일 하다가 잠자리 들어서 조금 이야기 나누는 것 정도가 일상이다. 각자 할 일 하다가 시덥잖은 말 한 두마디 던지면서 낄낄대는 것 외엔 자기 할 일 할 때는 자기 것만 따로 하기에 각자의 시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크다. 평일엔 저녁도 둘다 뉴스 보면서 각자 먹고 싶은 메뉴 간단히 먹으니까 더욱 그렇다. 그런데 그게 둘이 필요로하는 공통사항이라 서로 이를 존중해주는 것이 참 좋고 고마운 거다. 우리는 서로 뭐 배우고 하는 거 좋아해서, 같이 있지만 또 각자 저녁에 배움의 시간을 가진다는 점에서 닮아서 정말 좋다고 하니까, 인생의 목적은 배우는 데 있는게 아니냐고 한다. 항상 옌스가 강조하는게 general education의 중요성인데, 이걸 덴마크인스러운 것이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냥 옌스스러운 것이지.
이런 옌스와 살아서 딱히 문화충격을 받을 일이 없는 것도 있겠지만, 인도에서 겪은 문화충격이 워낙 커서 웬만한 다름에 충격을 크게 받지 않는 것도 있을 지도 모른다. 결국 어떻게 적응하고 사느냐의 문제로 인식하면 되는가 싶기도 하고. 또 곰곰히 뒤를 돌아봐 생각해보면 나름 여기서도 큰 문화충격을 받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 힘든 시간들이 대부분 잊혀지고 그냥 그 틀에 내가 녹아들어가 바뀌어 더이상 놀라울 게 크게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 나중에 다시 들춰보며 과거의 추억에도 잠겨보고, 스스로의 과오나 성과에서 배워도 보려고 별거 아닌 이런 생각의 조각들을 그래서 그때그때 남겨두는 거니까… 몇 년이 지나서 지금을 반추해보면 그땐 또 무슨 생각이 들런지…